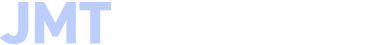Articles
- Page Path
- HOME > J Musculoskelet Trauma > Volume 35(2); 2022 > Article
- Review Article Lisfranc Joint Injury
- Bi O Jeong, Jungtae Ahn
-
Journal of Musculoskeletal Trauma 2022;35(2):83-89.
DOI: https://doi.org/10.12671/jkfs.2022.35.2.83
Published online: April 30, 2022
- 1,486 Views
- 14 Download
- 0 Crossref
- 0 Scopus
Abstract
The Lisfranc joint complex is composed of complex bony structures, ligaments, and soft tissues and has a systematic interrelationship. Sufficient radiologic modalities should be considered for an accurate initial diagnosis. Based on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normal anatomy and restoration of anatomical relationships, the diagnosis should be obtained, and more discussion is needed on detailed treatment strategies.
Published online Apr 25, 2022.
https://doi.org/10.12671/jkfs.2022.35.2.83
 , M.D., Ph.D.
and Jungtae Ahn
, M.D., Ph.D.
and Jungtae Ahn , M.D., Ph.D.
, M.D., Ph.D.
초록
리스프랑 관절 복합체는 복잡한 골 구조와 인대 및 연부조직으로 구성되며 복잡한 상호관계를 가진다. 정확한 초기 진단을 위해 충분하고 다양한 영상의학적 방법들을 고려해야 한다. 정상 해부학 구조의 정확한 이해에 기반한 진단과 해부학적 정렬의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하나, 치료의 세부 전략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Lisfranc joint complex is composed of complex bony structures, ligaments, and soft tissues and has a systematic interrelationship. Sufficient radiologic modalities should be considered for an accurate initial diagnosis. Based on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normal anatomy and restoration of anatomical relationships, the diagnosis should be obtained, and more discussion is needed on detailed treatment strategies.
서론
나폴레옹의 주치의였던 Jacques Lisfranc de St. Martin은 기병대에서 발생하는 중증 족부 외상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족근-중족 관절 간 절단술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다.1) 하지만 그 역사적인 유래와 달리 현대적인 의미의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손상은 중족부의 급성 골절이나 인대 손상에 의한 족근-중족 관절의 아탈구나 탈구 혹은 불안정을 유발하는 상태를 말한다. 전체 정형외과 외상의 약 0.2% 정도로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2) 저에너지 손상에 의한 인대 손상부터 고에너지 손상으로 인한 골절 및 탈구, 다발성 골절, 압궤 손상까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정확한 초기 진단과 치료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진단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초기 진단 누락률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또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상성 관절증 등의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부학적 구조
리스프랑 관절은 5개의 중족골 기저부와 3개의 설상골 및 입방골이 이루는 관절로, 특유의 복잡하고 치밀한 관절 구조, 다양한 인대 복합체와 족저 건막(aponeurosis) 등 주변 연부조직에 의해 고유한 안정성이 유지된다. 이로 인해 중족부는 단단한 궁(arch)을 이루어 신경 및 혈관과 힘줄이 족저부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
제1, 2, 3중족골은 각각 내측, 중간 및 외측 설상골과 연결되며, 제4, 5중족골은 입방골과 연결된다. 골 구조의 안정성은 크게 두 가지 형태학적 특성에 기인한다. 중족골 근위부와 설상골의 관상면상 단면은 족배부가 족저부보다 폭이 넓은 역삼각형의 형태를 가지며, 이로 인해 로마인 아치(Roman arch) 형태를 이루어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다.4) 제2중족골의 기저부는 중간 설상골과 연결되는데, 그 관절면이 주변에 비해 근위부에 위치하여 제2중족골 기저부가 내측 설상골과 외측 설상골 사이에 끼이는 쐐기돌(key stone)의 형태를 이룬다. 이러한 격자(mortise) 형태의 디자인으로 리스프랑 관절 복합체에 가해지는 내측 및 외측 전단력에 대해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골 구조의 안정성은 뼈들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것이므로 작은 전위라도 심각한 접촉면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제2중족골이 1 mm, 2 mm 전위되면 족근-중족 관절 접촉면은 각각 13.1%, 25.3% 감소된다.5)
골 구조의 안정성은 족배부, 족저부 및 골간 인대 구조 복합체에 의해 지지된다.6) 족저부의 인대 복합체 구조는 족배부에 비해 약 3배가량 더 튼튼하며,7) 이로 인해 중족골 기저부 골절 시 흔히 상방 전위가 발생한다. 다섯 개의 중족골 기저부 중 외측의 4개의 중족골은 횡중족인대(transverse metatarsal ligament)에 의해 서로 연결되며, 제1중족골과 제2중족골 기저부 사이에는 횡중족인대의 연결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특이하게 내측 설상골 외측면에서 제2중족골 기저부 내측면은 리스프랑 인대(Lisfranc ligament)로 연결된다.8) 리스프랑 인대의 길이는 약 8-10 mm, 두께는 약 5-6 mm이며, 리스프랑 관절에서 가장 강한 인대이다. 리스프랑 인대의 단독 손상에 의해서 중족부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9) 제2중족골 기저부의 골절을 유발하여 리스프랑 관절 손상 고유의 특이한 견열 골절 형태를 만들기도 한다.8) 또한, 제1족근-중족 관절은 전경골건과 장비골건 부착에 의해 추가적인 안정성을 얻으며, 족저근막과 족부 내재근도 리스프랑 관절 안정성에 기여한다.
리스프랑 관절은 이러한 해부학적 특성으로 인해 세 개의 열(column)로 나뉠 수 있다.10) 내측 열은 제1족근-중족 관절, 중앙 열은 제2, 3족근-중족 관절, 외측 열은 제4, 5족근-중족 관절로 이루어진다.11) 제2족근-중족 관절부는 시상면상 0.6도 정도로 운동성이 거의 없고, 첫 번째와 세 번째 족근-중족 관절은 각각 1.6도와 3.6도의 시상면상 움직임이 있다. 반면, 외측 열은 가동성이 있어 제4족근-중족 관절은 9.6도, 제5족근-중족 관절은 10.2도가량의 움직임이 있다.10) 이에, 제1, 2, 3족근-중족 관절은 입각기(stance phase)에 중족부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제4, 5족근-중족 관절은 보다 유연하여 균형감 있는 보행을 가능하게 한다.
손상 기전
리스프랑 관절의 손상은 다양한 기전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골절, 골절-탈구, 혹은 순수한 인대 파열에 의한 아탈구 등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연부조직 손상은 외관상 가벼운 부종 수준부터 완전한 탈장갑 손상(degloving injury)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리스프랑 손상은 크게 고에너지 손상과 저에너지 손상으로 나뉠 수 있다. 고에너지 손상은 주로 교통사고, 높은 곳에서의 낙상, 직접적인 압궤 손상(crushing injury), 또는 족저굴곡된 위치에서 가해지는 상당 수준의 축상 하중에 의해 발생한다. 미식 축구나 럭비 등의 스포츠 활동 시 선수의 전족부가 지면에 단단히 고정된 상태에서 족저굴곡된 발목의 뒤꿈치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축상 외력에 의한 것이 일반적이다.12) 압궤 손상은 중족부 배부에서 직접적으로 하중이 가해져 족저부 인대 파열 등 중증 연부조직 파열을 초래하며 구획증후군 발생 가능성이 높아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8) 저에너지 손상은 일반적으로 족저굴곡된 발이 비틀어지거나 전족부의 강제적인 외전에 의해 발생한다. 전족부의 극심한 비틀림과 외전은 오토바이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13) 겉으로 보기에 간단한 비틀림에 의한 손상으로 보이더라도 정확한 진단 전까지는 단순 족부 염좌로 저평가되어서는 안 된다.14)
진단
일반적으로 전족부와 중족부에서 중등도 내지 중증 부종을 관찰할 수 있다. 심한 경우, 외관상 전반적인 정렬이 뒤틀어지고 단축되거나 전족부가 넓어지고 외전된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혈행 및 관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족배동맥과 후경골 동맥을 촉진하거나 도플러 초음파 촬영을 시행할 수 있다. 심한 부종으로 인해 족배동맥 혈행이 잘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리스프랑 손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 파열 가능성은 정확히 배제되어야 한다. 족저부 반상출혈은 리스프랑 인대나 제1족근-중족 관절 파열의 병리학적 징후로 판단할 수 있어 다발성 손상이나 의식 저하 환자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15) 구획 증후군이나 개방성 골절-탈구, 혈관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응급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저에너지 손상에 의한 경우 초기 진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병력 청취, 수상 기전, 면밀한 이학적 검사가 필요하다. 이학적 검사 시 각각의 족근-중족 관절에 대한 국소 압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상 초기에 통증으로 인해 양발 혹은 한 발로 서기 어려운 경우, 수일 후 통증이 감소하면 체중부하 영상을 촬영한다.
고에너지 손상의 경우 단순 방사선 영상만으로도 쉽게 진단이 가능하지만 저에너지 손상의 경우에는 초기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전후면 영상은 족배부 표면에 수직 방향으로 촬영하며 건측과의 비교가 필수적이다. 단순 방사선 영상 확인 시에는 임상 소견을 잘 연관시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심한 초기 손상이 저절로 정복되어 정상 소견으로 보일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단순 방사선 영상을 통한 진단 시 의사마다 진단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경험에 따라 오진율이 39%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3) 스트레스 영상 촬영에 제약이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촬영만으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트레스 부하 영상이나 체중부하 영상을 촬영하여 손상 유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Fig. 1).
Fig. 1
(A) A 65-year-old female patient was diagnosed with Lisfranc injury with fleck signs on plain radiograph and computed tomography (CT). (B) In the intraoperatively performed abduction stress test, a widening of the first tarsometatarsal joint was confirmed, which was not visible on plain radiograph and CT. (C) Percutaneous pin fixations were performed for the first tarsometatarsal joint.
정상적인 단순 방사선 영상 소견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전후면 영상에서는 제1, 2중족골 기저부 내측연은 각각 접하는 설상골의 내측연과 상합성을 이룬다. 30도 내회전 사면 영상에서 제3중족골 기저부 내측연은 외측 설상골의 내측연과 정렬되고, 제4중족골 기저부는 입방골 내측연과 상합성을 이룬다. 측면상에서는 중족골 기저부와 각각 연결되는 설상골의 족배부의 정렬을 평가할 수 있으나, 골구조물이 겹쳐 보여 정확한 판독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어떠한 방사선 영상에서든지 비정상적인 정렬이 관찰된다면 리스프랑 손상을 적극적으로 의심하고 추가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
제2중족골 기저부에 부착하는 리스프랑 인대의 견열 골절에 의해 전후면 영상에서 작은 골편이 관찰되는 것을 fleck sign이라 하며 리스프랑 관절 복합체의 심각한 손상을 의미한다.14) 측면상 영상에서 족배부의 미세한 골편이 관찰되는 것도 의미 있는 소견이다.16) 단순 방사선 영상에서 다른 골절 및 아탈구 소견 없이 제1-2중족골 기저부의 간격이 2-5 mm로 증가된 경우에는 리스프랑 관절의 미세 손상(subtle injury)으로 정의할 수 있다.17)
통상적인 단순 방사선 영상으로는 1-2 mm의 아탈구를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5) 즉, 단순 방사선 영상이 정상이더라도 임상적으로 리스프랑 손상이 강력히 의심된다면 추가적인 영상학적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18) 골주사검사(bone scintigraphy)는 급성 미세 손상이나 1년 이상 누락된 진단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19)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은 미세 골절이나 2 mm 이내의 적은 전위, 아탈구 등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 더욱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3차원 재건 영상은 수술 전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은 리스프랑 인대 파열이나 미세 손상, 주변부의 골타박상 소견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Fig. 2). 하지만 현재의 통상적인 비체중부하 CT나 MRI는 체중부하 상태의 리스프랑 관절 복합체 구조의 손상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에 향후 기술의 발달에 따른 유용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Fig. 2
(A) A standing anteroposterior radiograph of a 22-year-old male patient injured during military training about a month ago showed persistent right midfoot pain. No significant diastasis was identified in the first and second metatarsal base areas. (B) In the T2-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e, the heterogeneous signal intensity of the Lisfranc ligament was observed in the axial plane image. (C) The T2-weighted sagittal image showed high signal intensity at the base of the second metatarsal and the intermediate cuneiform.
분류
역사적으로 족근-중족 관절 간격의 임상적 의미나 족저부의 인대 구조를 최초로 설명했던 것은 Jacques Lisfranc de St. Martin이었으나, 골절-탈구와 같은 리스프랑 관절 복합체의 급성 손상을 최초로 분류한 것은 Quénu와 Küss20)였다. 이들은 1909년 최초로 리스프랑 관절 손상을 중족골 기저부의 전위 방향에 따라 세 가지 주요 패턴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편심성(homolateral) 손상은 외측 혹은 내측 중 하나의 동일한 방향으로 모든 중족골 기저부가 아탈구 혹은 탈구되는 것이다. 두 번째, 단독성(isolated) 손상은 전체가 아닌 제1중곡골 혹은 제2중족골이 단독으로 전위되는 것이다. 세 번째, 개산성(divergent) 손상은 다른 방향 혹은 하나 이상의 평면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이후 1982년 Hardcastle 등2)은 족근-중족 관절의 상합성에 따라 세 가지로 다시 분류하여, 부분적인 상합성, 완전한 비상합성, 개산성 형태로 나누었다. 이후 Myerson 등8)은 변위의 정도와 방향을 더욱 세분화하여 이를 정립하였다. 이는 영상학적 형태와 손상 기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수상 당시 외력의 방향을 유추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21) 손상 패턴과 중증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분류 시스템의 예후적 가치가 부족하고, 임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골절 형태가 정확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8) 2004년 Zwipp 등22)은 매우 세분화된 분류인 ICI (Integral Classification of Injuries)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리스프랑 손상을 포함한 족부의 손상을 매우 자세하게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yerson분류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손상 형태를 완전하게 설명해내지 못하였다. 리스프랑 관절의 전위 정도는 미세 손상부터 완전한 해리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며, 인접한 족근골과 중족골의 동반 골절 역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영상학적 분류보다는 리스프랑 관절 복합체의 손상 정도, 해리 정도가 예후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23)
Nunley와 Vertullo19)는 리스프랑 관절의 미세 손상을 임상 소견, 체중부하 영상, 골주사검사 결과를 통해 분류하였다. 1단계 손상은 골주사 검사 양성을 보이나 체중부하가 가능하고 체중부하 영상에서 제1, 2중족골 기저부 사이 간격이 2 mm 이하인 경우로, 2단계 손상은 제1, 2중족골 사이 간격이 2-5 mm이고 체중부하 영상에서 종아치의 높이는 유지되는 경우로, 3단계 손상은 전위가 있고 측면 영상에서 종아치가 낮아진 경우로 하였다.
치료
리스프랑 관절 손상의 치료 목표는 통증없이 안정성을 확보하여 척행성(plantigrade) 보행과 이전 수준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고에너지 손상과 저에너지 손상의 치료는 구분되어야 한다. 고에너지 손상 시 동반 손상 확인과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한 추가적인 영상학적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부조직에 대한 평가와 적절한 초기 대처는 필수적이며, 개방창 없이 극심한 부종이 있는 경우 구획증후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에너지 손상 시에는 손상 정도에 따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반적인 해부학적 구조의 회복, 상호 관계의 재정립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행에 장해가 남을 수 있다.24)
1. 비수술적 치료
전위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의 리스프랑 손상은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다발성 손상 환자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족부 손상의 치료를 미룰 수 있다. 족배부 인대만 손상되고 족저부 인대 구조가 유지되어 있다면, 통증에 비해 해부학적 구조의 소실은 거의 없는 경우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석고붕대 고정 또는 CAM (controlled-ankle-motion) 부츠를 적용하고 4-6주간의 엄격한 비체중부하를 진행하여 치유 과정에서 충분한 강도의 반흔조직이 형성되도록 한다.25) 해부학적 구조가 유지된 상태로 회복된다면 퇴행성 변화나 골구조 변형, 통증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정성을 얻을 수 있으며, 관절이 안정화되지 않거나 초기 체중부하 혹은 일부 전위나 불안정 등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면 추후 재건술이 필요할 수 있다. 장기적 측면에서 관절 유합술로 인한 기능 저하의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2. 수술적 치료
리스프랑 손상의 수술의 주요 목표는 해부학적 정복이다. 정복의 적정성과 수술 후 기능적 결과 간의 연관 관계가 여러 문헌을 통해 보고된 바 있으나23,26,27,28,29,30) 상반되게 해부학적 정복 자체가 좋은 임상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8,23,31,32,33) 급성 리스프랑 관절 손상의 수술적 방법에는 크게 비관혈적 정복술 및 경피적 핀 고정술,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등이 있다. 하지만 최적의 고정 방법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34)
1) 비관혈적 정복술 및 경피적 핀 고정술
연부조직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수술 중 비관혈적 정복술만으로 충분한 정복을 얻었다고 판단되면 유관나사나 K-강선을 이용하여 고정할 수 있다. 고정 후 6주간 단하지 석고고정을 시행하고 비체중부하를 유지한다. 하지만, 비관혈적 정복술로는 수술 중 해부학적 정복 여부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어 수술 후 CT 등의 추가적인 영상학적 검사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해부학적 정복 실패로 인한 이차성 관절증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리스프랑 미세 손상 이외에는 핀 고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보고가 있다.
2)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비관혈적 정복으로 해부학적 구조의 회복을 얻지 못하거나 심한 불안정성 손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한다. 제2중족골과 내측 설상골 사이에서 정복을 방해하는 미세 골편 등은 모두 제거하여 정확한 정복을 얻어야 한다. 여러 관절 손상이 있는 경우 제2족근-중족 관절을 먼저 정복하고 K-강선 등으로 임시 고정하며, 나머지 관절들을 정복 및 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는 비교적 움직임이 적은 내측 열에는 금속판이나 유관나사 고정이 선호되며, 외측 열에는 K-강선 고정이 권장된다.21) 관절을 관통하는 나사 고정은 단단한 고정력을 얻을 수 있지만 관절과 인대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외상성 관절증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는 주장이 있다. 관절염을 더 잘 유발할 수 있다는 염려로 관절면을 건너 뛰어 족배부에서 금속판을 고정하는 방법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중족부에 특화된 잠김 금속판이 소개되어 골질이 불량한 경우에도 적절한 고정을 얻을 수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Endobutton을 이용한 내고정술이 소개되고 있는데,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내고정물 제거가 필요 없고 관절면 손상에 대한 우려가 덜하다는 장점이 있어 주목을 받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나 문헌마다 주장은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 고정 방법의 차이보다는 정확한 해부학적 정복 여부만이 의미 있는 결과의 차이를 보인다는 주장이 있지만,35) 이조차 여러 이견이 있다.
3) 일차 관절 유합술(primary arthrodesis)
최근, 불안정한 리스프랑 손상에 대해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보다 일차성 유합술의 임상 결과가 좋다는 메타분석 연구가 보고되었다.18,36) 하지만 분석에 사용된 환자 주관적 만족도 평가 척도의 적정성이나 최소한의 임상적 차이를 보이는 척도 점수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현재까지는 심한 리스프랑 관절 손상에서 일차 관절 유합술을 첫 번째 선택지로 고려하기에는 부족하더라도 그 문헌 근거는 점차 더 늘어가고 있는 정도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예후
불량한 예후인자로는 진단이 늦어지거나,18) 고에너지 손상이거나,37,38) Myerson 분류 A 혹은 C형 손상이거나,27,37,39) 연부조직 상태가 불량하거나,27) 3개의 열 중 고정이 필요한 부분이 더 많거나,39,40) 동측 하지에 동반 손상이 있거나,37) 순수한 인대 손상이거나,23,41) 골관절염의 영상학적 근거가 관찰될수록27)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Fig. 3), 정복의 정확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여러 이견이 있다. 지속적인 탈구, 퇴행성 관절염, 족부의 변형 시에도 기능적 결과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25,42) 치료 시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연구 결과는 부족하며, 영상학적 결과와 임상 결과 간의 연관성은 부족하다.
Fig. 3
(A) A 33-year-old female patient visited with midfoot pain and swelling. The fleck sign and widening of the first and second metatarsal base areas were identified in a plain radiograph. Subluxation of the Lisfranc joint was shown on computed tomography (CT). (B) Anatomical alignment was restored after the bridge plating. (C) At 3 years of postoperative follow-up, the traumatic arthrosis of the midfoot was shown in plain radiograph and CT.
결론
리스프랑 관절 복합체는 복잡한 골 구조와 인대 및 연부조직으로 구성되며 복잡한 상호관계를 가진다. 정확한 초기 진단을 위해 충분하고 다양한 영상의학적 방법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단순 방사선 영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 필요시 스트레스 영상, CT, MRI 등을 적극적으로 촬영해야 한다. 치료 결과에 대한 다양한 보고가 있으나 정상 해부학 구조의 정확한 이해에 기반하여 해부학적 구조의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한다. 치료의 세부 전략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Financial support:None.
Conflict of interests:None.
References
-
Lisfranc J. In: Nouvelle méthode opératoire pour l’amputation partielle du pied dans son articulation tarso-métatarsienne: méthode précédée des nombreuses modifications qu’a subies celle de Chopart [New operation method for amputations of the foot in tarso-metatarsal articulation: Method preceded by the many modifications of Chopart’s procedures]. Paris, Gabon: 1815.French.
-
-
Quénu E, Küss G. Étude sur les luxations du métatarse [Study on metatarsal dislocations]. Rev Chir 1909;39:1093–1134.
-

 E-submission
E-submission KOTA
KOTA TOTA
TOTA TOTS
TOTS




 Cite
Cite